중증장애우일상다반사(9)
내 삶 속의 또다른 나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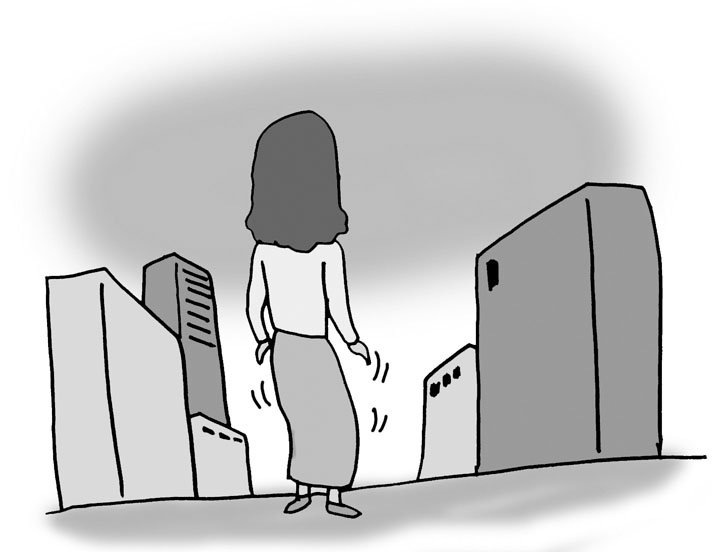 |
나는 태어나 8개월 때쯤 열감기 때문에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게 됐다. 내가 원해서, 나의 부모가 원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성장애인으로써의 삶이 시작됐다. 내가 ‘여성’이며 ‘장애인’이였기에 겪어야 했던 모든 상황들은 나뿐이 아닌 모든 여성장애인들도 경험했을 것이다. 아니 내가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겪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내가 그들이 아니기에 그들의 삶을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나도 여성장애인이기에 내 삶을 빗대어 그들의 삶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어린 나에게 동네 어른들은 무릎에 앉히고 “아이고 예쁘네!” 하고 뽀뽀와 등허리 등을 쓰다듬어 주며 “몸만 불편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저 내가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게 안쓰럽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때의 일들은 성추행이었다. 이제야 나는 그것이 성추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에게는 ‘동네 친구’라는 건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사다주신 인형과 소꿉장난 세트가 내 친구이자 놀이 상대였다.
그리고 초, 중, 고를 일반 학교를 다녔던 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점심 외에도 먹는 것을 자제해야 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내내 어머니는 나와 함께 수업을 받아야 했던 기억들… 지금도 늘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학교 다니는 동안 늘 문제였던 것은 화장실이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한군데도 없었고, 좌변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중학교 입학 후, 교장과 교감이 날 불러서 힘든 점을 이야기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나는 한참 민감한 사춘기 소녀였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나중에 내게 돌아 온 말은 “너와 비슷한 장애자들이(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다)다니는 특수학교로 옮기면 어떨까?” 였다.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 부모님은 끊임없이 선생들에게 촌지를 바치시며 당신 자식을 잘 봐 달라고 머리를 굽히시는 것이 너무 싫었던 나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내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을 가서 배우는 게 아닌데 왜 엄마가 그래야 하는 건데?” “엄마 앞으로 학교 에 오지 마” 라며 난 엄마 가슴에 상처와 아픔을 주기 일쑤였다. 정말 학교와 선생들이 싫었다.
나이가 들어가며, 다른 여성들도 그럴 때가 있듯이, 나 또한 치마를 입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다. 치마 입은 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몸도 불편한데 치마보다는 바지가 났지 않냐?” 라고 한마디씩 했을 때도 그저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이려니 했다. 치마 입고 뒤뚱뒤뚱 걷는 나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뚫어져라 계속해서 쳐다봤다. 나는 “쯧쯧~~”, “얼굴은 예쁜데 몸이 저래서 안됐어.” “저런 자식을 둔 부모는 오죽할까.” 라는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살아야 했다. 첫 생리를 했을 때도 주위 사람들은 “너도 생리를 하는 구나” 라고 했다. 그때 나는 어렴풋이 “나는 생리를 하면 안돼는 건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늘 그저 그런 거려니 하고 체념하며 지나쳤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내 장애 때문에 이런 거야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됐다. 난 다른 여성들과 틀린 것 없는 다만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뿐인데 왜들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난 왜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걸까… 그 때부터였나, 난 ‘왜! 왜!’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버릇이 생겼다.
나는 12년 학교생활을 끝내면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나는 생활 전반에서 억압과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그래도 남성 장애인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조금은 있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인 내가 들어 갈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에도 없다. 취업준비 교육프로그램 또한 선택의 폭도 극히 좁았다. 여성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양재나 뜨개질, 생산직 등이 전부였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때마다 난 나의 장애를 탓했으며 사회 제도와 시스템 문제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
때로는 남자친구와 길을 가거나 하면 우리에게 쏠리는 시선이 싫어 사람을 피해 만나기 일쑤였다. 결혼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내 장애를 이유로 거센 반대의 횡포에 부딪히게 됐으며, 결국은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장애인 그것도 여성장애인은 연애와 결혼이 허락되지 않는 존재란 말인가?
나는 7년 동안 운영하던 도서대여점을 IMF 로 인해 가계를 그만둔 후 우연히 여성장애인 모임에 참여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게 됐고 그로인해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억압과 폭력이었고, 차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장애 때문에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아픔들, 차별, 억압과 폭력들을 다시는 다른 여성장애인들은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현 사회는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어 내며 같은 여성인 여성장애인에게 또다른 폭력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외모지상주의 사회는 여성장애인을 다시 매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억압과 차별의 횡포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 사회는 스스로를 반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꼭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사회의 모든 인식은 변해야 할 때다. 울면 떡 하나 던져 주는 방식의 복지시스템과 그러한 복지제도를 빙자하여 고립시키려는 행정 시스템은 사라져야 된다. 끝으로 여성장애인 더 나아가 장애인은 모든 이들과 동등한 인격체이며 시혜의 대상이 아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며 늦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 글쓴이의 요청에 의해 ‘장애인’으로 표기합니다.
글 이희정
그녀는 현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이의 닉네임은 ‘머풍’ 이란다. 이는 ‘사랑이 머무는 풍경’이 줄임말이라고 설명해줬다. 희정 씨는 여성장애우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닉네임처럼 늘 사랑이 머무는 풍경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고를 부탁하는 기자에게 희정씨는 원고지 16매 안에 여성이고, 장애우였기 때문에 받은 차별을 어떻게 다 담겠냐고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다. 이 땅의 모든 여성장애우들이 이런 원고를 부탁 받았을 때, 쓸 말이 없어서 원고가 펑크 나는 날이 오길 희망해본다.
작성자이희정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